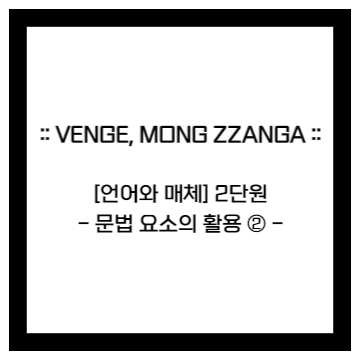ㅇ 피동표현과 사동표현
1. 피동 표현
1) 능동문 :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
2) 피동문 :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
- 능동문의 동작주인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나타남
- 능동문의 동작주인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동작주로 드러나지 않음
3) 문법적 변화
(1) 주어 → 부사어
Tip. 피동문에서 부사어는 '에게, 에, 에 의해(서)'가 붙어 형성됨
Tip. 피동문처럼 동작주가 부사어로 바뀌면 동작상이 약화됨
(2) 목적어 → 주어
(3) 능동사 → 피동사
4) 실현 방법
|
종류
|
실현 방법
|
|
파생적 피동문
|
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‘–이, -히, -리, -기’가 결합
Tip. 피동 접미사가 붙어 피동사가 되는 능동사는 대부분 타동사의 형태
|
|
명사에 피동 접미사 ‘-되다’가 결합함
|
|
|
통사적 피동문
|
어(아)지다 : 주로 타동사에 붙어 쓰임
Tip. 자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용하기도 함
|
|
게 되다 : 자동사, 타동사, 형용사에 붙어 쓰임
Tip. 의견이 분분하여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인정하나 빼는 경우도 많음
|
Tip. 의도성이 있으면 주로 통사적 피동문, 없으면 주로 파생적 피동문임
5) 피동문의 제약
(1) 피동문이 형성되기 어려운 능동문
-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'무정명사'인 경우
(2) 대응되는 능동문 설정이 어려운 피동문 ex) 날씨가 풀렸다
- 행위의 동작주 설정이 어려움
2. 사동 표현
1) 주동문 :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
2) 사동문 :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
Tip. 행동을 시키는 주체를 표현하여 사건의 결과가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나타낼 수 있음
3) 문법적 변화
(1) 주어 → 목적어
(2) 주동사 → 사동사
(3) 주동문에는 없음 → 새로운 주어
4) 실현방법
|
종류
|
실현 방법
|
|
파생적 사동문
|
주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‘–이, -히, -리, -기, -우, -구, 추’가 결합
Tip. 모든 단어에서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님
|
|
명사에 사동 접미사 ‘-시키다’가 결합함
Tip.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
|
|
|
통사적 사동문
|
게 하다 : 자동사, 타동사, 형용사에 붙어 쓰임
Tip.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, 목적어, 주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
|
5)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구분
(1) 직접사동과 간접사동
- 직접사동 :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
- 간접 사동 :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뿐 자신이 직접 그 행위에 참여하진 않음
Tip. 파생적 사동은 주로 직접사동이나 간접사동으로도 표현 가능,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으로만 해석
Tip. '읽히다, 웃기다, 울리다'는 간접사동만 가능
(2) 문장 구조의 차이
- 부사의 수식 범위
-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'-시-'의 쓰임
Tip. 파생적 사동문은 사동주를, 통사적 사동문은 사동주의 행위, 피사동주, 사동주와 피사동주를 높임
6) 사동문의 제약
(1)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은 사동 형성이 불가함
(2) 대응되는 주동문 설정이 어려운 피동문이 존재함
- 피사동주가 무정명사나 추상명사일 경우 ex) 철수가 책을 책상 위에 올렸다
범인이 진실을 숨겼다
- 사동문의 특정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임 ex) 철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을 붉혔다
(3) 통사적 사동이 어려운 경우
- 피사동주가 무정 명사인 경우 표현이 어색함 ex)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산을 남게 했다.
ㅇ 부정 표현
: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부정문이라 함
|
|
짧은 부정문
(부정 부사로 실현)
|
긴 부정문
(부정 용언으로 실현)
|
|
의지 부정
(‘안’ 부정문)
|
부정 부사 ‘안’을 사용함
|
‘-지 않다’를 사용함
|
|
능력 부정
(‘못’ 부정문)
|
부정 부사 ‘못’을 사용함
|
‘-지 못하다’를 사용함
|
1. 안 부정문
1) 의지 부정 : 동작 추제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냄
2) 단순 부정 :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을 부정
3) '안' 부정문의 제약
- 서술어가 동사라 하더라도 주어가 무정명사인 경우 의지부정 불가
- 인지동사(알다, 깨닫다, 인식하다 등)은 '안'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음
|
|
의지부정
|
단순부정
|
|
동사
|
가능
|
가능
|
|
형용사
|
불가능
|
가능
|
2. 못 부정문
1) 능력 부정 : 동작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없는 것
2) '못' 부정문의 제약
-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
- 서술어에 행위를 바랄 만한 성질이 아닌 경우
-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
- 심리적 상태
- 완곡한 거절이나 강력한 거부
|
|
능력부정
|
|
동사
|
가능
|
|
형용사
|
불가능
Tip. 긴 부정문으로 쓰이면 ‘기대에 미치지 못함’이라는 의미로 성립 가능
|
3. 말다 부정문
- 긴 부정문 형식으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쓰임
- 예외적으로 희망 · 기원을 나타내는 서술어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
Tip. 이 경우 평서문, 형용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
4. 부정표현의 중의성
: 부정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
1) 예시
A가 꽃을 안 샀다
(1)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꽃을 샀다
(2) A가 꽃이 아닌 다른 것을 샀다
(3) A가 꽃을 산 것은 아니다(보기만 함)
2) 해소 방법
- 발화 시 강세를 표현
- 문장의 경우 보조사 '은/는'을 사용함
5. 이중 부정
: 한 문장 안에 부정 표현이 두 번 이상 사용된 경우
-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함
Tip. 단, 못 부정문은 이중 부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